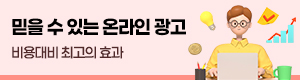지금 전주에 2개의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제17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 2개의 축제가 출발한 지는 3년이란 시차가 있다. 십수년의 세월동안 이 축제가 이어져 오면서 ‘전주’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었다. 하지만 이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짧은 단상을 가져본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2개의 축제를 지켜보면 이들 축제가 서로 상반되는 컨셉과 내용이지만 축제기간이 비슷하여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주고 있다 보여 진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제축제는 인도·중국 등 46개국 19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한지축제는 7개 분야 30개 이밴트가 진행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숫자로 보면 상당한 내용이 있는 축제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영화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상영해 주는 것이 주가 된다면, 한지축제는 작은 손길들이 모아져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다. 그렇다고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이질적인 것을 비교하는 우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2개의 축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한번 쯤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자는 것이다.
1997년 한지축제,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 2000년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이 무렵에 3개의 대형 축제가 만들어졌다. 당시는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로써 문민정책을 펼치며 독재자를 추출하거나 새로운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는 때였다. 거기에 호남출신인 김대중 정부가 바로 이어져 우리 지역으로써는 문화부흥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던 시절이다.
여기에 민선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새로운 대형 축제가 만들어지기 수월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계소리축제를 만들지 않고 1959년부터 시작한 대사습놀이를 글로벌이밴트로 잘 키웠다면 성격이 비슷한 대형행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5월 들어 2개의 축제를 경험하면서 축제라는 것을 지역발전이나 지역산업의 동력으로 만드는 원천으로 만들자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축제도 일종의 문화산업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축제에 대한 디자인, 축제에 대한 예산도 그에 걸맞게 편성하고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기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출발 당시 한지축제는 3억원, 2개의 행사는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 지금까지 한지축제는 수십억원, 2개의 축제는 수백원의 국민의 세금을 소모 했다. 매년 회수만 늘어가는 행사인지 정말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생활에 이바지하는 행사인지 이쯤해서 공과를 검토해 문화산업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지 점검해야 한다.
문화는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고, 산업은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다. 축제는 이 둘의 가치를 잘 조화롭게 성취해 내야 축제로써 지속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화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한지축제의 관계자들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축제를 치르고 있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영화제 관계자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영화제로 전주시민의 품격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부심보다는 전주라는 정체성, 예산대비 효율성, 미래지향적 발전성 등 여러 평가지표를 만들어 합리적 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냉혹한 평가를 받아만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보완해야 할 점을 보완해 주는 전주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만 축내는 행사라면 과감히 없애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효율적인 대안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5월을 맞이하여 거리의 나부끼는 배너깃발처럼 모든 시민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쯤해서 2개의 축제 갖는 의미를 단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