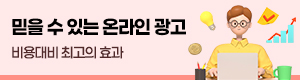실핏줄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뒤틀리고 막힐 때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 언론이 그렇다. 실핏줄에 해당하는 중소 매체가 '진실추구'라는 본래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1탄 '벼랑 끝 내몰린 중소 언론 기자' 보도에 이어 후속으로 한국 중소 매체의 사례를 짚어봤다.
# “온, 오프라인과 잡지까지 다 합쳐서 아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신문은 50부 그냥 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터의 통화가 아니다. '취재 섭외'를 맡은 신입기자의 목소리는 애절하기까지 하다.
# 잡지사에 돈을 대는 지주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홍보가 필요하면 잡지사 대표는 편집기자를 다그친다. “빨리 빨리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대충 편집해서 인쇄소에 넘기는 게 최우선 과제다.
# “신문사인데요. 귀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계셔서요...”소비자 사연이야 구구절절 적혀있는 제보 내용을 적당히 ‘가공’해서 쓰면 되고, 말미에 기업체 입장 한 줄만 넣어주면 기사는 완성된다.
대한민국 중소 언론사의 단상이다.
기자들은 통신사 뉴스를 짜깁기해 홈페이지는 물론 신문과 잡지에도 싣는다. 사무실 곳곳에는 이렇게 찍어낸 책자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정기 독자는 없고, 모두 ‘광고용’이다. 따라서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발행이 미뤄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취재 섭외’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섭외는 회사 수익과 직접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돈을 받고 기자증을 판다. 상근 기자보다 객원 기자가 훨씬 더 많다. 기자 업무 대신 책자를 팔거나 광고를 따온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광고 이익은 30~50% 남짓. 회사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대부분의 업체는 편집국장이 본연의 업무 보다는 광고와 판매에 집착하는 게 현실이다. 취재기사는 없고 디자인 도용은 개의치 않는다.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기업 고발 기사가 나가지만, 실상은 광고 유치를 위한 협상에 목적이 있다.
팩트 확인이라도 할라치면, 할당된 기사부터 채우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제보자의 억울한 사정이야 딱하지만,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아침, 저녁으로 기자를 달달 볶는 데스크의 말은 한국 중소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 기자, 열심히 광고 좀 따자. 그래야 인센티브도 챙기고...서로 좋잖아. 안 그래?”